[지식콘서트] 손봉호 고신대 교수의 인문학 '최소 수의 최소 고통'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인문학 대중 강연 프로그램 '인문학 아고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손봉호<사진> 고신대 석좌교수가 '아프게 하는 사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윤리'란 제목으로 한 강연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인간에게 아주 궁극적인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행복이고, 하나는 고통이다. 파스칼은 "인간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싫어한다"고 했다. 이것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벤덤은 말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두 가지다. 쾌락과 고통이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란 두 절대적인 주권의 통치 하에 두었다."
그런데 행복과 고통은 같은 무게라 할 수 없다. 칼 포퍼는 "행복과 고통이 대칭적인 게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행복과 고통의 차이
행복과 고통의 또 하나의 차이는 행복은 계속되면 못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 불행하다가 행복해지면 그 때는 좋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 버리면 행복하다는 것을 못 느낀다. 참 안타깝다.
그런데 문제는 고통이다. 고통은 그렇지 않다. 처음 병이 났을 때는 물론 아프다. 그러나 계속되면 좀 안 아파야 될 것 아닌가. 행복과 비슷하다면 말이다. 그런데 계속 아프다. 그래서 심각한 것이다. 사실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고통이다. 사람들이 왜 자살하고, 안락사를 택하나? 죽음보다 고통이 더 힘드니까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병이 났을 때 안 아프면 큰일 난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처음에만 아프고 그 다음부터 안 아프면 어떻게 할까? 안 고친다. 그러면 죽어버린다. 왜 계속 아픈가? 고치라고 아픈 것이다.
그래서 안 아픈 병은 심각하다. 세상에 몹쓸 병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암이고 하나는 한센 병이다. 그런데 이 두 병의 공통되는 특징이 안 아프다는 거다. 아플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그러니 아프다는 것은 축복이 될 수 있다.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다
고통이라는 건 육체의 문제 만은 아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다. 그럴 때 '도대체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나',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니체는 "문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나 하는 절실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 없음이 인류 위에 내려진 저주"라는 것이 그의 유명한 주장이다.
그런데 칼 레비트라는 철학자는 반대로 인류의 역사가 의미 있으려면 고통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 또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유대인 정신의학자인데, 아우슈비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가 나중에 말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보니까 몸이 튼튼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살아남지 않더라.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 만이 살아남더라." 그는 삶에 어떤 의미라도 있다면 반드시 고통에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도 아파본 일이 없고, 어려움 당한 일도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피상적이고, 시시한 사람이 됐을 것이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고통의 경험이 없었다면 인류 문화는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나라에 재미있는 도시가 두 곳 있다. 하나는 수도 암스테르담이고, 또 하나는 항구 도시 로테르담이다. 암스테르담은 옛날 도시인데 2차 대전 때 폭격을 안 당했다. 그러니까 옛날 도시 그대로 있다. 옛날에 마차밖에 못 다니던 길을 그대로 둬서 자동차로는 꼼짝도 못하고, 자전거 타는 게 제일 빠른 도시가 돼 있다. 로테르담은 완전히 폭격을 당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지금은 번쩍번쩍한 새 도시이다.
'아무도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을 당한 사람은 그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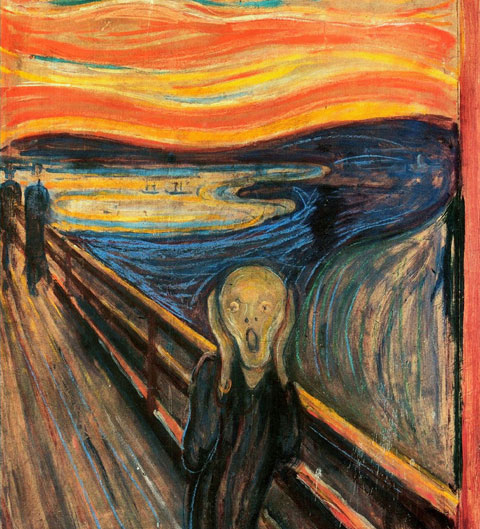
고통은 어디서 오나
그럼 도대체 고통이 어디서 오나. 옛날 사람들은 모두 신의 의지라 생각했다. 그러니 제사를 지내고, 굿을 한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의식이 좀 바뀌니까 '자연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실제로도 그렇다. 홍수, 가뭄, 벼락, 지진, 화산 같은 것들이다. 인류가 그 동안 노력한 것이 바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을 줄이고, 자연의 힘을 이용해 편리하게 살려고 한 것이다. 그게 과학기술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고통이 없어져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정말 그런가? 현대의 한국인은 과거에 가난하고 아무 과학기술도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불행하다고 느낀다. 왜 그럴까. 또 다른 적(敵)이 나타난 것이다. 과거에는 자연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했는데, 오늘은 누가 고통을 가하느냐. 사람이 사람에게 고통을 가한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토마스 홉스가 17세기에 한 말이다. 인간은 서로 잡아먹으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이 다 늑대는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모두 늑대적인 요소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서라도 내가 좀 덕을 보려고 한다는 거다. 거기서 오늘의 인간의 고통이 일어난다.
자연보다 사람이 주는 고통이 훨씬 악독
문제는 자연보다 인간이 주는 고통이 훨씬 악독하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 상 가장 큰 자연재난은 1931년 중국에서 일어난 홍수라고 한다. 400만 명이 죽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이 군인만 해도 수천만 명이다. 히틀러는 재판도 거치지 않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다.
나치의 만행을 조사해 기록하고 보관하는 비젠탈 센터라는 곳이 있다.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편지를 써보낸 것이 어느 잡지에 소개됐다. 그녀가 아우슈비츠에 수용돼 있을 때 이야기다. 어떤 젊은 부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독일 군인들이 그 아기를 축구공처럼 찼다. 아이는 당장 피투성이로 죽어버렸다. 그 어미에게 그걸 보게 했다. 그러고는 그 구두에 묻은 피를 그 어미의 블라우스를 찢어 닦으라고 했다는 거다. 그 할머니가 끝에다 쓰기를 '그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고 했다.
시민사회가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제도적 장치는 사람에 의해 가해지는 억울한 고통을 막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고통이 상당 부분 인간에 의한 것이란 전제 위에 이뤄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 만으로 윤리적 행위를 자극해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최소 수의 최소 고통'이 윤리 근거 돼야
인간에게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보다 더욱 강력한 것은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이다. 또한 윤리라는 것은 더 큰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제거에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최대 다수의 최대 쾌락'보다는 '최소 수의 최소 고통'이 윤리적 당위성의 근거가 돼야 한다.
그런데 '최소 고통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이론도 공리주의가 가진 약점, 즉 정의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롤스가 제시한 '차등의 원칙'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
즉 여러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의 어떤 행위가 그 중 한 사람의 고통 밖에 줄이거나 제거하지 못할 경우, 나는 그 둘 중 고통을 더 많이 당하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줄이려고 해야 한다. 또 사회 전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고통을 가장 많이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고통의 감면이 이뤄지도록 세워져야 한다.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 共存共生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진다 레드우드 시티(미국)=배정원 조선비즈 기자
- 인터넷 땡처리라니? 신뢰를 사고파는 相生모델될 것 뉴욕=윤형준 기자

- 진화하는 유통시장… 고객 유혹하려면 온·오프 잘 섞어야 강희석 베인앤컴퍼니 파트너
- 인문학으로 배우는 비즈니스 영어 'Inspire' 조승연 오리진보카 대표
- 간디, 손자 이야기 들어주기 위해 대통령 미팅도 거절 배정원 조선비즈 기자
- "인터뷰 요청 큰 영광입니다만…" 칙센트미하이 제안 우아하게 거절한 피터 드러커 배정원 조선비즈 기자
- 유럽중앙銀 양적 완화 美·日처럼 경제회복?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
- 경영권 승계, 핏줄 아닌 전문경영인을 믿어라 장세진 KAIST 경영대 교수
- 엄정하되 너그러워야 사람의 마음 보인다 이한우 문화부장
- 다 버려라… 핵심만 빼고 팰러앨토(미국)=배정원 조선비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