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View & Outlook
인공지능은 대리인… 인간 지능 뛰어넘을 수 없는 운명
이대열 예일대 신경과학과 석좌교수
- 0
- 0
[WEEKLY BIZ Col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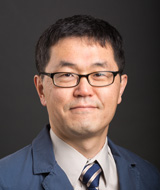
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도 많다. 무엇보다, 새로 개발된 인공지능의 성과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될 방법을 찾으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곧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수퍼 지능이 되는 특이점(singularity)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답하려면, 우선 지능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지능은 생명체 자기 복제의 수단
지능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럼에도 인간의 지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능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 지능이란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바둑처럼 그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 하더라도, 단 한 가지 문제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은 성능이 좋은 계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된 지능이라고 할 수 없다. 아무리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바둑 대신 오목 같은 단순한 게임밖에 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높은 수준의 지능이라고 할 수 없다.
지능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생명체의 기능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자기 복제라는 생명체의 고유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만 비로소 특정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었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왜 알파고는 이세돌 9단을 이기기 위한 수를 선택했을까? 알파고를 개발한 엔지니어들이 승리를 원했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의 목표가 이세돌 9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알파고는 아마 가장 극적이고 아슬아슬하게 지는 수를 선택했을 것이다.
지능의 우열을 결정하는 것이 생명체의 선호도라는 것은 기생충들의 행동 전략을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대부분의 생명체와는 달리, 남의 장에서 살아가는 기생충들은 원하는 동물에게 잡아먹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남의 뇌를 조종해 현재의 숙주가 더 나은 미래 숙주에게 잡아히도록 하는 기생충도 있다. 쥐의 장내에서 번식한 뒤, 쥐의 뇌로 이동해서, 그 쥐가 다음번 자신들의 숙주가 될 고양이에게 잡아먹히도록 하는 톡소 포자충이 대표적이다. 쥐가 자신의 천적인 고양이를 쫓아다니는 것을 쥐의 지능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쥐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톡소 포자충의 지능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능은 그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생명체가 다양한 환경에 처하게 될 때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영양분을 찾아서 헤엄치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박테리아나, 뿌리와 가지가 뻗어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식물에게서도 지능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지능이 생명체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우리가 오로지 인간이나 인간과 친한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의 지능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인간중심적인 사고일 뿐이다.
뇌와 유전자, 서로 갈등하기도
단순한 생명체의 선호도와 지능은 유전자와 직결되어 있다. 그렇지만, 인간처럼 복잡한 뇌를 가진 동물의 행동을 유전자의 복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수많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뇌가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도킨스가 말한 대로 뇌는 유전자의 자기 복제 과정을 보조하기 위해 최적화된 생존 기계의 한 부분이다. 뇌를 포함한 동물의 신체는, 마치 유목민들의 천막과 같은 일시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생식세포가 새로운 개체를 만들고 나면 쇠퇴 소멸하는 게 순리이다.
하지만, 동물의 뇌는 예상하지 못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전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식을 습득하고 그에 따라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사장이 직원을 고용하고 나면 직원이 하는 일을 전부 다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직원에게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유전자와 뇌 사이에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본인-대리인의 관계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이해의 상충이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뇌가 유전자가 필요로 하는 자기 복제를 등한시하는 경우는 많다. 뇌가 잘못된 습관을 고집해서 개체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그런 경우이다. 이와 같은 유전자와 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많은 해결책을 생각해내고, 그들 간의 우열을 비교한 후,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메타인지라고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사회를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시켜 갈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의 대리인으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자기 복제 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한 그것이 인간과 대립되는 선호도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진정한 지능이 될 수도 없다. 이렇게 지능의 본질과 인공지능의 한계를 분명히 파악하면, 인공지능이 인류를 완전히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